진달용 교수의 '과학 저널리즘의 이해'
소셜 미디어 시대 맞아 저널리즘 환경 급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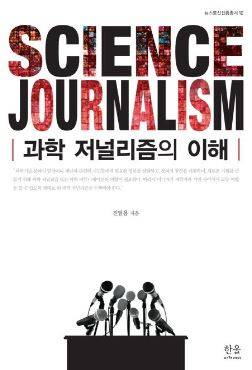
지난해 초 서아프라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당시 치사율 90%를 육박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에볼라 공포'는 국내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한 대학이 개최한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에 아프리카 학생 30여 명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하루에만 만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언론들은 '죽음의 바이러스'라 이름 붙이며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SNS에서도 하루에도 수백 번 씩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논의와 정보가 쏟아졌다. 이렇듯 지난 여름 '죽음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뉴스거리였다.
당시 대한민국에 무섭도록 휘몰아쳤던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들을 미디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전통적 의미의 과학 저널리즘은 주로 과학 면을 통해 접하는 자연과학, 의학과 보건 분야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넓은 의미의 과학 저널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은 물론, 기후변화, 자연재해, 위기 보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소셜 미디어 시대 맞은 과학 저널리즘…"재교육 필요"
방송과 저널리스트들의 전문 지식 부족과 잦은 오보 등으로 신뢰가 실추되면서, SNS가 새로운 대안 미디어로 등장한 지 오래다. 청중은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들의 정보가 때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네팔 대지진 사고 때에도 봤듯이, 재난 위기시 이들은 전통 미디어보다 더 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과학 뉴스를 바꾸어 나가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저자는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탐사보도의 기준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과학 저널리즘의 신뢰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급변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저널리즘은 정보 채널 독점이 아닌 개방형 구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자는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 저널리스트들은 소셜 미디어 시대가 등장하면서 저널리즘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보의 독점과 관리 방법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화된 청중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가를 재교육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과학 저널리스트들의 재교육이 사회 전체의 변화 속에서 놓치기 쉬운 언론 윤리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 '과학 저널리즘 윤리' 다시 되새겨야 할 때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렸다. 논란 초기, 언론은 황우석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PD수첩'이 제기하는 논문 의혹 가능성에 대해 침묵 혹은 부정으로 일관했다.
앞선 두 '논문 조작 스캔들'은 그들의 성과가 '과학적 증명'이 아닌 '언론플레이'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황 교수는 언론을 통해 복제 송아지 '영롱이' 출산 장면이나, '인간 황우석'을 조명하게 했다. 자신을 '국민 과학자'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다. 논문 조작 사태가 벌어진 초기, 그는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몰골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들은 '국민 과학자'를 욕보인 괘씸죄를 저지른 'PD수첩'을 향해 돌팔매질했다. 오보카타 역시 '예쁜 외모' 덕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 저널리즘의 윤리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황 교수 측 의견만 맹목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실성, 중립성, 도덕적 책임감 등을 지켜야 했다. 황우석 신드롬을 조장한 것도 언론이요, 그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언론이었다.
이같은 과학계의 어두운 면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태 대부분이 미디어 윤리와 접목되기 때문이다. 과학 저널리즘 뿐 아니라 모든 저널리즘이 속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별없이 뛰어든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발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 윤리원칙이 잊히는 이유기도 하다.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일수록 그 사태는 심각해진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학기술의 취재 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고도의 저널리즘 윤리의식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댓글 정렬